표준어는 그냥 “서울말”일까?
많은 분들이 “표준어는 서울에서 쓰는 말”이라고 생각합니다.
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,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어요.
조선 시대에는 지역마다 말이 달라서 경상도, 전라도, 강원도, 제주도 사투리가 매우 강했습니다.
서로 다른 고을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일도 많았어요.
그러다 보니 나라 차원에서 “모두가 공통으로 쓰는 말”을 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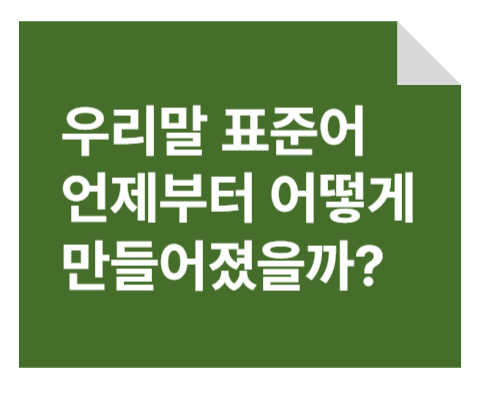
🌱 일제강점기와 표준어의 시작
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.
1926년, 조선어학회(훗날 한글학회)가 **<한글 맞춤법 통일안>**을 발표하며 표준어 정리 작업을 본격화했어요.
당시 조선어학회는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.
✅ 사람들이 가장 널리 쓰는 말
✅ 서울 지역에서 쓰는 말을 중심으로
✅ 고유어를 최대한 보존
이런 이유로 오늘날 표준어가 “서울말” 중심이 된 거예요.
🌿 표준어는 변하지 않는 걸까?
아니에요. 표준어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.
예를 들어,
- “구슬프다”는 표준어지만, 요즘엔 거의 안 쓰이고
- “짜장면”은 한동안 비표준어였다가, 2011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.
- “어이없다”는 표준어이고, “어처구니없다”도 함께 쓰는 말로 인정받았습니다.
이렇게 언중(말을 쓰는 사람들)이 계속 쓰는 말이 표준어가 되거나, 표준어에서 빠지기도 해요.
🌸 표준어와 사투리의 경계
표준어가 정해지면서 사투리가 마치 “틀린 말”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, 사실 사투리는 지역의 문화와 개성이에요.
요즘에는 사투리도 소중한 언어유산으로 인정받고,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죠.
👉 부산 사투리
- “밥 묵습니까?” (밥 먹었습니까?)
👉 전라도 사투리 - “어찌 그라고 있던가?” (왜 그렇게 있어?)
이렇게 우리말은 표준어와 사투리가 함께 어울려 발전해 왔습니다.
🌟 표준어, 우리의 살아있는 언어
표준어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 약속한 공통어예요.
하지만 동시에, 잘 안 쓰이지만 아름다운 표준어들이 우리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.
하릴없이, 곰살맞다, 고즈넉하다 같은 단어들을 조금씩 써보면, 우리말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.
💬 마무리 이야기
표준어의 역사는 “정해진 규칙의 역사”라기보다는,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.
앞으로도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단어가 표준어가 되고, 어떤 단어는 사라지기도 하겠죠.